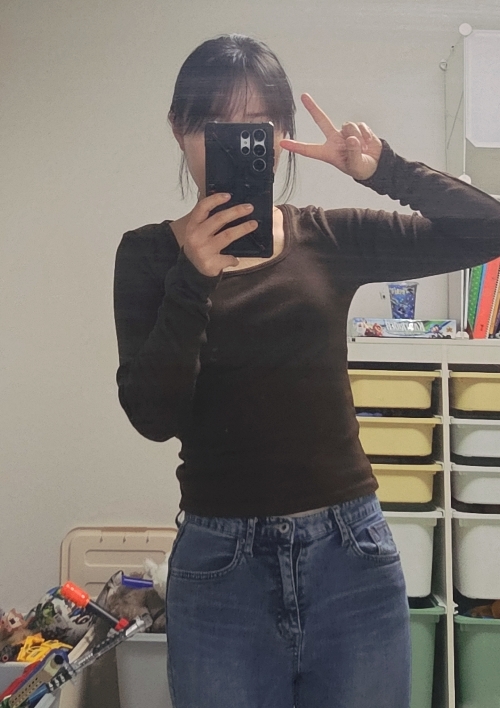
그를 향한 내 마음은 애틋하고 애끓는 사랑이지만,
그가 내게 주는 마음은 무용지물이다.
"회원님, 이 페이스대로 쭉 가봅시다. 잘하고 계세요!"
운동하는 내내 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.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런지 운동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. 운동 이후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.
똥멍충이 같은 그는 절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.
sns를 찾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를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. 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가까이에서 피드백 받고 싶고, 내 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sns 활동을 하는데, 이 활동으로 그가 상처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. 무슨 소리냐면 소설 #1에서 남자주인공이 애매모한 행동으로 욕을 굉장히(?)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다. 그는 아마 내가 늙은 사람 골탕 먹이려는 줄 알고 나를 괘씸하다 생각하겠지? 분명해.
그리고 그에게 알려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보는 앞에서 꾹꾹 눌러쓴 내 마음을 그에게 읽어주긴 싫다.
그러면 방송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내 고백이 되어 버리니까.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를 보러 갈 자신이 없다. 날 사랑하지 않는 그는 내가 마냥 이상하고 웃긴 사람처럼 보이겠지만, 난 아니니깐.
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보는 앞에서 노래든 춤이든 뭐든 할 자신이 없다. 모르는 사람 앞에서야 상관없지만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 나는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.
똥멍청이. 메롱이다. 절대 안 알려줄 거다.
똥멍청이라고 불러도 이제는 상관없다. 그는 더 이상 내 글을 읽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까. 내 글을 읽었으면 하다가도 안 읽었으면 하고... 안 읽었으면 하다가도 읽었으면 하고. 나 원래 이렇게 변덕쟁이였나?
"하고 싶어, 넣고 싶어, 하고 싶어"
"안돼"
그의 눈동자에 비친 빛은 걱정이었다. 뭘 걱정하는 거지? 곧이어 무얼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다.
"입으로 해줄까요?"
"아니"
"피났었던 건 괜찮아요?"
"응, 괜찮아요"
날 걱정하는 거였다. 어째서지? 난 전혀 어리지도 않고, 그가 준 통증보다는 그와 함께한 시간이 주는 행복이 내게는 훨씬 크고 좋았는데, 그는 대체 뭘 걱정하는 거지?
순간, 내 글을 봤나....?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.
임신이 어렵다는 글 때문인가? 아니면, 피를 보고 경험이 많지 않은 내가 어리숙하고 지겨운 건가?
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어가며 고민해 봤지만 아마 답은 비슷한 경험이 있는 후자인 듯하다. 어리숙하다고 싫어하는 거겠지.
첫 남자도 그랬었다. 처음에는 처음이라는 이유로 좋아했지만, 같은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싫은 이유로 바뀌었으니까.
첫 남자와는 '알려주면, 배우겠다'로 그 위기를 넘겼지만, 어른 남자와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다. 그가 날 어리숙하다고 경험이 없어 싫어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. 슬프다.
"마. 흔. 넘으면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합니다"
마흔을 강조하며 말하는 그가 귀여웠다 ㅎ
반백살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이리도 귀여워도 되는 걸까. 분명 나이 많다고 놀려서 마흔에 강조를 한 것일 거다.
3일을 계란찜으로 먹고, 식단을 해야 하는 대장내시경은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했다. 대식가인 사람이 적게 먹으면, 죽는다. 그러니 나는 평생 대장내시경을 못할 것이다. 내 건강을 위해 하는 검진에서 굶어 죽을 순 없는 일이니까.
'언제쯤 그의 손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'
'언제쯤 그의 손이 싫증 나고 지겨울까'.
뻔히 알고 있는 손의 느낌에도 온몸의 세포를 깨우기에 충분히 충분했다. 그의 손이 그리워 그가 내 몸에 머물렀듯 내 손이 머물렀지만, 그를 대신할 순 없었다. 내겐 그가 필요하다.
가지고 싶다, 그의 손이.
갖고 싶다, 어른 남자가.
그의 손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한 나와
내 입속에서 녹아내리기를 시작한 그.
보고 싶었다, 그의 망가지는 얼굴이.
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, 어른 남자가.
자세를 바꾸고 싶었다. 그를 눕혀두고 마음껏 맛보고 싶었다. 그를 내려다보고 싶었다. 그의 움직임과 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.
입속에서 더 부풀리기를 하는 그. 얼른 그런 그를 내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. 그 시간만큼은 내게 유일한 그를 가지는 시간이었으니까. 내게는 그 시간이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다. 그러나 그는 "안된다" 말했다. 그의 안된다 한마디는 내게는 "너의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, 날 가질 수 없다"라는 의미로 내게 다가왔고, 날 무너져 내리게 하는 말로 충분했다. 그러나 그는 계속된 나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. 그는 어쩔 수 없이 내 세상으로 들어왔지만, 부풀리고 있는 그는 내 세상에 들어오길 원하고 있었다. 깊숙이 그리고 천천히 내 세계로 입장했다. 내게서 절대 나가지 않았으면 했다. 계속 내게 머물길 바랐다. 시간이 멈췄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랬다. 빠져나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.
내 세상에 들어온 그를 격렬하게 반겨주었고, 환영했다. 그리고 어둠이 드리운 나의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바꾸는 그. 곧이어 내 세상에서 빠져나와 부풀린 그를 다시 나의 입속 세상으로 들여놓았다. 더 이상 부풀지 않을 것 같던 그는, 한없이 더 부풀어져 있었고, 입속 세상을 가득 채웠다. 입속 세상에는 하얀 함박눈이 내렸다. 부풀린 그는 차갑게 내리는 함박눈에 추위를 이기지 못했다.
나는 그를 사랑한다.
그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.
남자 경험이 없었단 이유로 매력 없고 어리숙한 여자라 생각할지라도, 함박눈을 먹는 나를 문란란 여자라 생각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.
그를 보러 가는 나를 밀어내고 쫓아내지 않는다면, 그 무엇이든 나는 좋다. 그런데 자꾸 욕심이 생긴다. 그를 보러 가는 시간만큼은 내 것이기를. 내 사람이기를.
그리고 내게 없었던 욕망이 그를 향해 끊임없이 생겨난다. 아마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겠지.
똥멍충이.
그가 내 글을 보고 있다면, 그를 향한 처절한 마음을 알면서도 단 한마디도 안 한 그가 밉다.
반면에 그가 내 글을 안 보고 있다면, 나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셈이니 기분 나쁘다.
어느 겨울에 밀려온 마음 하나.
'감성 글쟁이 > 엽편소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엽편소설)#1-176 가고 싶어요 (0) | 2024.11.29 |
|---|---|
| 엽편소설)#1-175 관심과 관음 사이 (6) | 2024.11.28 |
| 엽편소설)#1-173 무채색을 닮았어요 (0) | 2024.11.27 |
| 엽편소설)#1-172 사랑 없는 사랑 할래요? (0) | 2024.11.27 |
| 엽편소설)#1-171 겨울비 (1) | 2024.11.26 |



